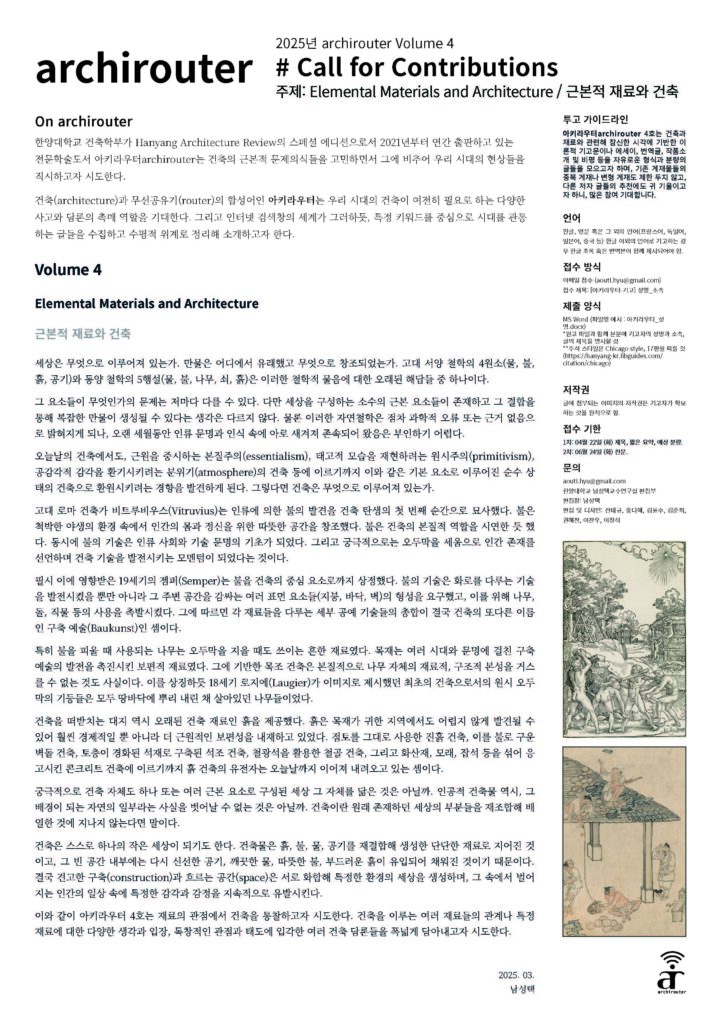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만물은 어디에서 유래했고 무엇으로 창조되었는가. 고대 서양 철학의 4원소(물, 불, 흙, 공기)와 동양 철학의 5행설(물, 불, 나무, 쇠, 흙)은 이러한 철학적 물음에 대한 오래된 해답들 중 하나이다.
그 요소들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저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세상을 구성하는 소수의 근본 요소들이 존재하고 그 결합을 통해 복잡한 만물이 생성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르지 않다. 물론 이러한 자연철학은 점차 과학적 오류 또는 근거 없음으로 밝혀지게 되나, 오랜 세월동안 인류 문명과 인식 속에 아로 새겨져 존속되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늘날의 건축에서도, 근원을 중시하는 본질주의(essentialism), 태고적 모습을 재현하려는 원시주의(primitivism), 공감각적 감각을 환기시키려는 분위기(atmosphere)의 건축 등에 이르기까지 이와 같은 기본 요소로 이루어진 순수 상태의 건축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건축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고대 로마 건축가 비트루비우스(Vitruvius)는 인류에 의한 불의 발견을 건축 탄생의 첫 번째 순간으로 묘사했다. 불은 척박한 야생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몸과 정신을 위한 따뜻한 공간을 창조했다. 불은 건축의 본질적 역할을 시연한 듯 했다. 동시에 불의 기술은 인류 사회와 기술 문명의 기초가 되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오두막을 세움으로 인간 존재를 선언하며 건축 기술을 발전시키는 모멘텀이 되었다는 것이다.
필시 이에 영향받은 19세기의 젬퍼(Semper)는 불을 건축의 중심 요소로까지 상정했다. 불의 기술은 화로를 다루는 기술을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공간을 감싸는 여러 표면 요소들(지붕, 바닥, 벽)의 형성을 요구했고, 이를 위해 나무, 돌, 직물 등의 사용을 촉발시켰다. 그에 따르면 각 재료들을 다루는 세부 공예 기술들의 총합이 결국 건축의 또다른 이름인 구축 예술(Baukunst)인 셈이다.
특히 불을 피울 때 사용되는 나무는 오두막을 지을 때도 쓰이는 흔한 재료였다. 목재는 여러 시대와 문명에 걸친 구축 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킨 보편적 재료였다. 그에 기반한 목조 건축은 본질적으로 나무 자체의 재료적, 구조적 본성을 거스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상징하듯 18세기 로지에(Laugier)가 이미지로 제시했던 최초의 건축으로서의 원시 오두막의 기둥들은 모두 땅바닥에 뿌리 내린 채 살아있던 나무들이었다.
건축을 떠받치는 대지 역시 오래된 건축 재료인 흙을 제공했다. 흙은 목재가 귀한 지역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될 수 있어 훨씬 경제적일 뿐 아니라 더 근원적인 보편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점토를 그대로 사용한 진흙 건축, 이를 불로 구운 벽돌 건축, 토층이 경화된 석재로 구축된 석조 건축, 철광석을 활용한 철골 건축, 그리고 화산재, 모래, 잡석 등을 섞어 응고시킨 콘크리트 건축에 이르기까지 흙 건축의 유전자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셈이다.
궁극적으로 건축 자체도 하나 또는 여러 근본 요소로 구성된 세상 그 자체를 닮은 것은 아닐까. 인공적 건축물 역시, 그 배경이 되는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건축이란 원래 존재하던 세상의 부분들을 재조합해 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이다.
건축은 스스로 하나의 작은 세상이 되기도 한다. 건축물은 흙, 불, 물, 공기를 재결합해 생성한 단단한 재료로 지어진 것이고, 그 빈 공간 내부에는 다시 신선한 공기, 깨끗한 물, 따뜻한 불, 부드러운 흙이 유입되어 채워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견고한 구축(construction)과 흐르는 공간(space)은 서로 화합해 특정한 환경의 세상을 생성하며,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일상 속에 특정한 감각과 감정을 지속적으로 유발시킨다.
이와 같이 아키라우터 4호는 재료의 관점에서 건축을 통찰하고자 시도한다. 건축을 이루는 여러 재료들의 관계나 특정 재료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입장, 독창적인 관점과 태도에 입각한 여러 건축 담론들을 폭넓게 담아내고자 시도한다.
2025.3. 남성택